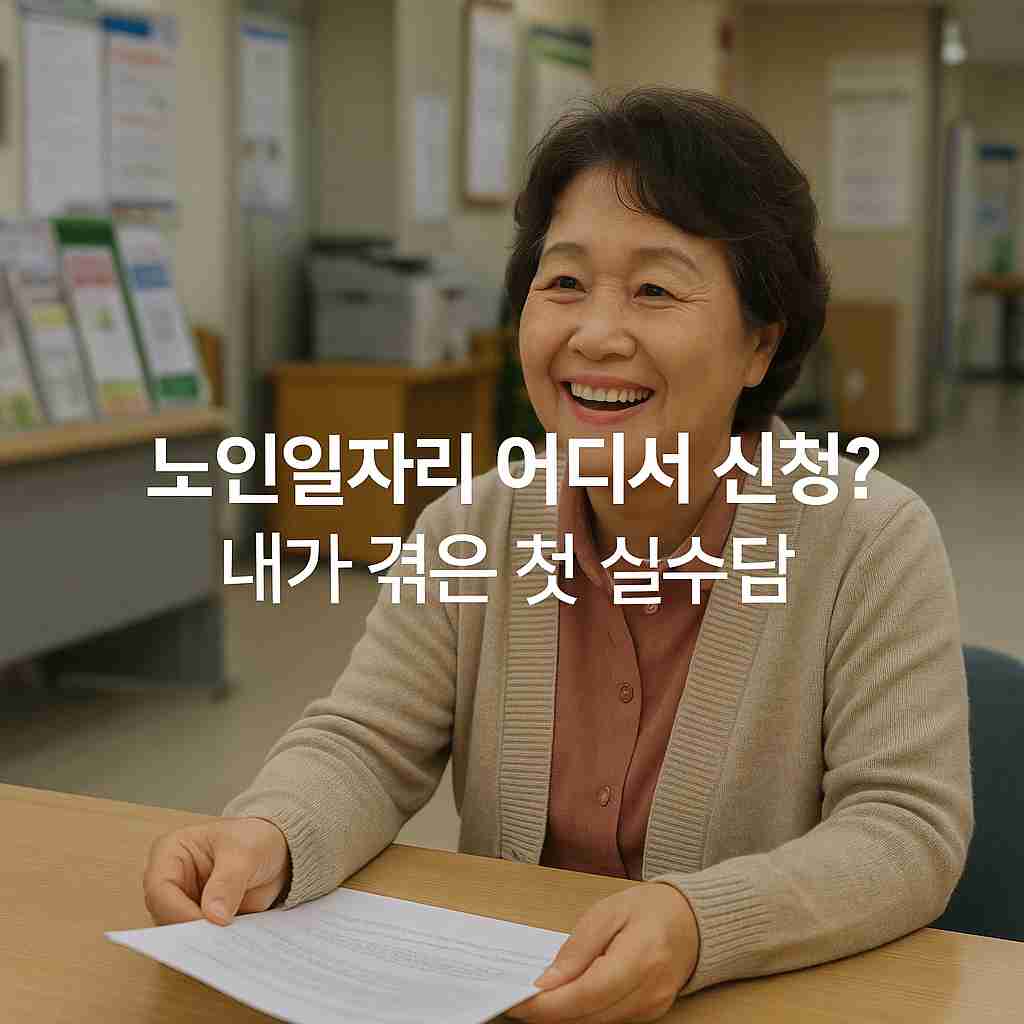아무것도 하지 않기엔, 하루가 너무 길었던 날
그날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도 작년 늦가을이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데, 문득 제 자신이 너무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 도시락 싸고 출근 준비 챙겨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애들도 다 커서 제자리 찾아 나가고, 남편도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아니… 나 아직 멀쩡한데,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혼자서 말도 하네, 싶어서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마트가 아닌 동네 정육점에 들렀어요.
옛날엔 거기서 고기도 사고 떡갈비도 사다 아이들 도시락 반찬 해줬거든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언니 요즘 어디 다녀?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해?”
그 말이 저한테는 꽤 세게 박혔어요.
예전에는 어디 가나 부지런하다고 칭찬도 받고, 무슨 일 맡겨도 척척 해냈는데…
지금은 뭔가 축 처진, 힘없는 사람처럼 보여졌나 봐요.
그때 아주머니가 말해줬어요.
“나도 요즘 노인일자리라는 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일주일에 두 번 나가서 교통지도 하는데, 하루 두 시간이라 힘도 안 들고, 사람도 만나고. 언니도 한 번 알아봐봐.”
그 말이, 그날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검색은 했지만… 도무지 모르겠던 그 날 밤
집에 와서 핸드폰을 들고 ‘노인일자리 신청’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복지로, 노인일자리포털, 워크넷… 이름도 낯선 사이트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무슨 공고는 떴는데, 로그인하래요.
회원가입부터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메일 인증을 하라는데, 그 이메일 비번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몰라 몰라!” 하면서 짜증이 확 났죠.
결국 밤 11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다 잤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
‘내가 왜 이걸 하겠다고 했지…’
포기할까 하다가도, 그 정육점 아주머니 얼굴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 밝은 얼굴이요.
나도 저렇게 다시 웃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구청에 간 날, 민망함과 친절 사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직접 물어보자 싶어서 구청에 갔어요.
민원실 안내데스크에 앉아 계시던 직원분한테 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노인일자리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그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거기서도 한 번 당황했어요.
“어르신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확 뜨거워졌어요.
‘어르신’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아직 제 나이가 60대 초반인데,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그래도 직원분이 너무 다정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복지과로 안내받아 올라가서 상담을 받았죠.
신청 자격은 만 60세 이상,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내 손에 맞는 일이 뭘까, 고민이 많았던 시기
일자리가 다양했어요.
학교 앞 교통지도, 도시락 배달, 공원 환경 정비, 행정 도우미, 실버카페 근무까지…
종류는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체력도 생각해야 하고, 낯선 환경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도서관 봉사를 신청했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책 정리하고 문서 정리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죠.
근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책이 은근히 무겁더라고요.
높은 선반에 올리려다 허리 삐끗한 날도 있었어요.
“아이고, 이건 나랑 안 맞는다…” 싶어서,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중단했어요.
처음엔 창피했어요.
“내가 이것도 못 버티나?” 싶은 자책도 들었고요.
근데, 그 실수 덕분에 저한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었어요.
도시락 배달,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따뜻한 시간
도서관 봉사를 그만두고, 다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추천받은 게 도시락 배달이었어요.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분들께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고, 잠깐 안부를 묻는 일이었죠.
첫날은 정말 떨렸어요.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말은 어떻게 걸지?’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의외로, 문을 여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더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 손을 꼭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 분은 제게 따뜻한 차까지 내주셨어요.
“배달하시느라 추우셨죠?” 하시면서요.
그 한 잔에, 제가 마치 누군가의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일상이 다시 따뜻해지던 순간들
지금은 그 도시락 배달을 5개월째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세 번,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12시쯤 마무리돼요.
힘들기도 해요.
특히 겨울엔 손이 꽁꽁 얼고, 비 오면 우산 쓰고 도시락 들고 뛰어야 하니까요.
근데도 저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누군가가 제 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참 고맙고 행복하거든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면, 표정이 달라져요.
저도 그랬어요.
거울 보면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고 신기했어요.
“아… 나 아직 살아있네.” 그런 느낌이었죠.
일은 일이지만, 삶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달력에 기념일도 없고, 출근도 없고, 만나야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지금은요, 그 어르신들 생신도 기억해두고, 요일별로 누가 어디 계신지도 외워놨어요.
“다음 주엔 반찬 바뀐대요” 이런 정보도 서로 공유해요.
이젠 그분들이 저한테는 작은 가족 같아요.
주민센터에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 교육 도와드릴 때도 있어요.
처음 왔던 그날의 저처럼, 어리둥절해 하는 분들한테요.
“처음엔 다 몰라요. 해보면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제가, 스스로 대견해요.
처음 노인일자리 신청할 때 겪었던 헷갈림 정리표
| 헷갈렸던 순간 | 실제로 알게 된 것 | 느낀 점 |
|---|---|---|
|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 ‘구청 복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었음 | 직접 가보는 게 훨씬 빠르고 편했어요. |
| 사이트마다 로그인하라 해서 포기함 | 복지로, 워크넷, 노인일자리포털이 각각 역할이 다름 | 처음부터 누가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
| 일자리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려움 | 도서관, 교통지도,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함 | 체력이나 성격에 맞게 고르면 돼요. |
| ‘어르신’ 소리에 민망했던 기억 | 60대부터 신청 가능, 대부분 같은 연령대 |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위안이 됐어요. |
| 실패하면 창피할까 걱정됨 | 한 번 바꿔도 괜찮고 다시 신청 가능함 | 도서관에서 실패했지만, 덕분에 딱 맞는 일 찾았죠. |
마음속에 남은 말 하나
정육점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
“언니도 일자리 해봐. 괜찮다니까~”
그 말이 없었으면, 아마 전 아직도 TV 앞에서 졸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그 말을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아직 멀쩡하잖아요. 해봐요, 생각보다 따뜻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예전엔 웃고 넘겼는데요.
지금은 그 말이 꽤나 깊고 진지하게 느껴져요.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의 하루에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의미가 돼요.